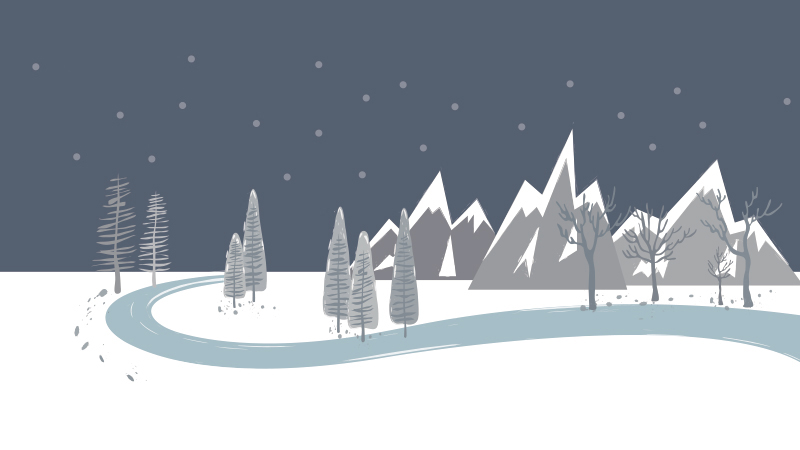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지만 타인이 빛이 되는 때가 적지 않다. 심지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타인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
10여 년 전 어느 겨울방학 기간에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안동을 거쳐 숙박지인 백암온천까지가 첫날의 일정이었는데 하회마을과 부용대 등 유서 깊은 유적지를 구경하다 보니 오후가 다 지나갔다. 서둘러 이른 저녁을 먹고 백암온천을 향해 출발했는데 한 겨울철이어서 금방 어두워지더니 진눈깨비마저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다. 안동에서 백암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 아니면 적어도 4차선 도로 정도는 될 거라고 짐작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였다. 더구나 여러 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다. 더구나 안동시를 조금 벗어날 즈음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더니 도로 위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도 앞뒤에 차량 한 대도 보이지 않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적막한 산길 운전을 계속해야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 모두 다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았고 쌓여가는 눈 만큼 차 안의 긴장감도 쌓여갔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불구불한 산길은 마치 혀를 날름거리며 덤벼드는 한 마리 뱀 같았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불구불한 산속의 눈길을 홀로 가야 했기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했다.
두려운 침묵이 한층 깊어질 무렵 갑자기 산 아래쪽 마을에서 차량 한 대가 올라왔다. 그야말로 절묘한 시점에 훅 치고 들어와 보란 듯이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바라본 옆 좌석 아내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다. 얼마쯤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잠시나마 뒷좌석의 애들에게도 가벼운 농담을 건네는 여유도 조금 생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차는 우리가 묵을 호텔 바로 옆까지 가는 것이었다. 엄청난 함박눈이 내려 쌓이는 산길을 극도의 공포 속에서 홀로 가야 했던 우리 차를 거의 한 시간 동안, 그리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길잡이 역할을 완수한 후에 그 차는 말없이 사라졌다. 앞 차를 향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저절로 손을 흔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아내는 누군가가 일부러 우리를 위해 보낸 것만 같다고 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마침내 등장했다고 해석해야만 쉽게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어둠 속의 빛’이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은인으로 남은 그 타인은 우리 가족이 여행할 때마다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리하여 그날에 긴장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우리를 돌보는 그런 타인이 존재했음에 다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곤 했다.
혹시 나도 그런 보이지 않는 선행을 교직 생활 중 베푼 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다가 이제부터라도 평생 기억에 남는 빛이 되는 타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내 발자취가 누군가의 힘든 삶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되고 희망의 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다. 사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타인들이 밝혀준 빛 덕분에 삶의 고비를 넘어온 적이 꽤 있었던 것 같다. 그중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알아차린 경우는 그 차량의 불빛 같은 경우였지,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쳐 버린 소중한 빛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러한 빛들이 모두 다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깨달은 것은 감사한 일이다. 세상에 빚진자라는 생각하며 밝히는, 내 마음속의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 본다.
요즈음 여름철에는 하회마을을 지나 백암온천으로 가는 길목에는 배롱나무길이 이어지는 모양이다.
약 20km 남짓 되는 도로변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이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꼽히고 있다. 올여름에는 그곳에 가고 싶다. 타인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내면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다시 다짐하면서 그 길을 넘어가고 싶다.